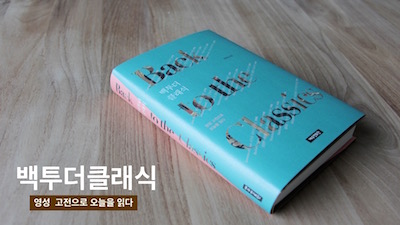긴급한 사명
- 토마스 머튼의 《냉전 편지》-
지난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국토의 곳곳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고, 여러 언론들은 광복 직후의 낙후된 모습과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비교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잠시 감격에 젖게 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벌어진 팽팽한 군사적 대치는 온 민족을 다시 ‘오래된 위기’로 몰아넣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을 계기로, 북한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고, 남한은 전면전 돌입을 경계하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다. 비록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긴장이 평화적으로 완화되고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그저 ‘쉬고 있는’ 분단국가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더욱 더 이웃나라 중국은 지난 9월 전승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전쟁 참여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수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는 뜨거운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처럼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무엇이라 설교해야 할까?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이자 사회비평가인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비밀스러운 공개편지
토마스 머튼의 《냉전 편지》(Cold War Letters)는 일종의 ‘목회 서신들의 묶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목회(牧會)는 좁은 의미에서 한 목회자가 특정한 교회를 맡아 회중들을 지도하는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 영적 지도자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관한 지혜와 권면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울의 서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기독교 영성사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통해 영적 지도를 행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머튼의 《냉전 편지》는 1961년 10월부터 1962년 10월까지,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쓴 111통의 편지 모음집이다. 49통의 편지를 모은 첫 번째 묶음은 1962년 4월에 나왔고, 거기에다 62통의 편지를 추가한 두 번째 묶음은 1963년 1월에 나왔다. 모두 등사되어 스프링으로 제본된 형태로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 회람되었다. 그런데 갖가지 통신, 인쇄 기술이 발달한 20세기 중반에 이렇게 머튼이 ‘편지’와 ‘등사’라는 수단을 활용하게 된 데에는 흥미로운 사연이 있다.
먼저 토마스 머튼은 베네딕트 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트라피스트회(Trappist)의 수도자였다. 그는 1941년 12월 미국 켄터키의 겟세마니 수도원(Abbey of Gethsemani)에 들어간 이후, 줄곧 수도원 안에서 침묵과 기도와 노동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 《칠층산》(The Seven Storey Mountain,1948)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젊은 수도자 머튼은 수도원 담장을 넘어 매우 영향력 있는 영성 작가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자서전 외에도 기도와 영성 생활에 관한 에세이집과 시집을 여러 권 출판하였는데, 그의 글에 감명을 받은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엽서와 편지들이 수도원으로 날아들었다. 이처럼 외부 세계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수도원 안에 살던 머튼에게 ‘편지’는 친구들과의 소통이나 영적 지도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이유는 머튼이 수도회에 속한 수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공적으로 출판하는 모든 글들은 수도회의 검열을 거쳐야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침묵을 강조하는 트라피스트회의 당시 장상(長上)들은 머튼이 영성 생활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장려했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머튼은 1961년 이후 전쟁과 군비 경쟁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가톨릭계 간행물들1에 기고하였고, 그것은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트라피스트 수도회 총장 가브리엘 소르떼(Dom Gabriel Sortais: 1902-1963)는 마침내 1962년 4월 머튼에게 더 이상 전쟁에 관한 주제로 글을 출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정식 출판된 책이 아닌, ‘등사된 편지 묶음’이라는 형태는 머튼이 장상들의 지시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수도회의 검열을 피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이용한 방법이었다. 사실 검열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오던 머튼은 공식적인 출판 금지 지시가 내려지기 이전인 1961년 말부터 자신의 편지들을 ‘비밀스러운 공개편지’로 유통시킬 계획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이런 이유로 《냉전 편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8년이 지난 2006년에야 정식 출판되었다. 또한 그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글 모음집인 《기독교 이후 시대의 평화》(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 역시 1962년 4월에 완성되었지만, 등사본으로 읽히다가 그의 사후인 2004년에야 출판될 수 있었다.2
긴급한 위기
그렇다면 머튼은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의 “냉전 편지들”은 역사적으로 “베를린 위기”(Berlin Crisis)가 일어난 1961년 10월부터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가 있었던 1962년 10월 사이, 곧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에 쓰여 졌다. 두 사건 모두 냉전 시대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 사이에 일어난 군사적 대치로, 두 강대국은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행히 미국 대통령 케네디(John F. Kennedy)와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냉전’(cold war)이 실제 무력을 사용하는 ‘열전’(hot war)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한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전 세계를 휘감았던 시기였다. 머튼은 당시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했다. 그는 1961년 12월 런던의 한 대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상 도덕적 붕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속에서 국가의 정책은 거의 노골적으로 멸망의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운명론적인 무관심으로 수용하거나, 무책임성과 수동성 속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회와 성직자들이 거의 완벽하게 침묵해왔다는 사실입니다.(9)3

머튼이 느낀 위험은 일차적으로는 핵폭탄,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인해 인류가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여긴 것은 그러한 무기들을 생산하고 다루는 인간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무책임한 태도였다. 호전론(戶錢論)자들은 소련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비 확충과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머튼은 무기 산업이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의 무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 무기가 우리를 분노하게하고 필사적인 상태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을 [미사일 발사] 버튼 위에 올려 두고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17). 그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엇보다 긴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의 신학자들,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교부 신학이나 전례 등에 대한 작은 문제들에만 신경을 쓸 뿐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5). 그래서 머튼은 지금 서구 기독교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추상적인 형식”(8)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불확실의 영역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고 개탄하였다(3). 이러한 사실들이 그로 하여금 긴급히 펜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머튼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다하여 전쟁을 폐지하고,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하는 것이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임을 확신하였다(2).
새로운 길을 찾아서
머튼은 이러한 위기를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도덕적, 영적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하였다. 그는 호전론자들이 “공산주의는 악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비도덕적이고 세속적일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기독교적임을 폭로하였다(6). 구체적으로 머튼은 도로시 데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 또는 그가 속한 무리의 행동이나 정책으로부터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악을 다른 이들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형제자매가 아닌 죄인과 악당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향한 우리의 증오와 폭력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11). 나아가 그는 당시 미국의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Robert F. Kennedy)의 아내이며,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제수였던 에설 케네디(Ethel Kennedy)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러시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입니다. …… 우리는 완전히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옳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육신을 입은 악마들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거대한 환상입니다.”라고 말하며, 증오와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과 상대편을 진실하게 직면할 것을 역설하였다(10). 곧, 머튼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 제거해야할 것은 상대진영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 그리고 그 전쟁의 뿌리가 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증오라고 믿었다.4
머튼의 이런 견해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정부의 정책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충(不忠)한 국민으로 간주되었으며, 전면적인 핵전쟁을 외치는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튼은 비록 콜롬비아 대학시절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에 잠시 기웃거린 적이 있긴 했지만, 그의 생애에 걸쳐 공산주의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공산주의가 교회와 자유세계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임을 지적한다(32). 또한 그는 전쟁에 저항하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운동이 오류에 빠질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머튼은 평화운동가인 제임스 포리스트(James Forest)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비폭력운동에 공격성과 도발성이 은밀히 내포됨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편의 마음을 더욱 강퍅하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들 수도 있으며(31), 평화운동가가 행동주의(activism)의 파도에 휩쓸리면 또 다른 종류의 “대중적 인간(mass-man)”, 곧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채 대중의 의견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되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69). 이와 같이 머튼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거칠고 무분별한 평화운동은 전쟁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길을 추구하였을까?
이처럼 당대의 문제를 도덕적 위기로 파악했던 머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덕원리를 세움으로써 전면전을 피하고 전쟁 폐지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 분열과 대치를 해결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기독교 인간주의(Christian Humanism)”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머튼이 주장한 “인간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이해하는 태도를 말한다.(8) 이것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바탕을 둔 비인간적인 “정글의 법칙(jungle law)”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자연의 법칙(natural law)”에 따라, 원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자연적 본성’(nature)을 지닌 형제자매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태도이다(11).
물론 머튼은 자신이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구처럼 그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추구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중도(sane middle path)를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32) 그런데 이때의 ‘중도’는 보통 정치적으로 말하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자적 또는 회색주의자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머튼은 《냉전 편지》를 등사하여 배포하는 일을 맡아 주었던 윌버 페리(Wilbur H. Ferry) 민주제도연구소(Center for Democratic Institutions) 부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까지 제가 시도해온 것은 기본적인 도덕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심각하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원칙 말입니다.”(48) 또한 그는 다른 편지에서 “제3의 위치, 통합의 위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것은 냉전시대의 좌우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적인 신조와도 상관없는 새로운 위치이다.5
‘행복을 주는 약’을 버리라
로널드 W. 드워킨(Ronald W. Dworkin)은 《행복의 역습》(Artificial Happiness, 2006)이라는 책에서, 1950년대 이후 미국의 교회는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인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행복’과 ‘긍정적 사고’에 대한 강조가 대표적 예이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늘날 종교를 ‘정신작용약물’을 사용해서 ‘인공적인 행복’을 제공하는 의료산업과 비슷한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다고 논증한다.6 일찍이 토마스 머튼은 당시 기독교 매체와 교회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면서도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수동적이게 만드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믿음은 그저 “행복을 주는 약(happiness pill)”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3).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설교단과 서점 진열대도 “행복을 주는 약”들이 오랫동안 점령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한국 교회의 도덕적, 영적 위기를 초래하는 데에 크게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머튼의 《냉전 편지》는 비록 반세기 이전에 쓰여 진 것들이지만, 시대의 도덕적 영적 위기에 대한 그의 통찰과 제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마도 머튼이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영적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이 갱신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며 심원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갱신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사적 위기에 대한 참된 영적 이해입니다. 이것은 그 위기들을 내적 의의와 인간의 성장과 인간 세계에서의 진리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69)
분명히 기억해야 것은 ‘영성 목회’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와 회중의 만족을 위한 ‘행복을 주는 약’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 토마스 머튼에 의하면, 설교자는 당면한 역사적 위기에 대한 참된 영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복을 주는 약’을 던져 버리고, 정치적 좌우를 넘어서는 도덕원칙, 통합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할 긴급한 의무가 있다. 그래야 영적 갱신이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글쓴이 : 권혁일. '산책길' 기독교영성고전학당 연구원. Ph.D. Candidate(Graduate Theological Union, 기독교 영성학). 《백투더클래식》을 편저하였고, 《제임스 게일》, 《베네딕트의 규칙》 등을 번역하였다.
'산책길'은 2015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월간지 〈목회와신학〉에 '영성 고전에서 배우는 영성 목회'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목회와신학〉의 양해를 얻어 산책길 팀블로그에서도 매달 글을 게재합니다. 위의 글은 2015년 11월 호에 "도덕적·영적 관점에서 본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실린 열한 번째 글입니다.
- 대표적인 매체로는 도로시 데이(Dorothy Day: 1897-1980)가 이끌던 《가톨릭 노동자》(The Catholic Workers)가 있다. 도로시 데이는 비폭력 사회 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으며, 가톨릭교회에서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그녀의 삶을 높이 평가하여 성인으로 추대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생전에 머튼과 데이는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고, 《냉전 편지》에도 머튼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가 2통 포함되어 있다. [본문으로]
- Cold War Letters는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Peace in the Post-Christian Era는 분도출판사에서 《머튼의 평화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본문으로]
- 인용문은 필자가 Cold War Letters (Orbis, 2008)에 수록된 원문을 번역한 것이며, 괄호 속의 번호는 냉전 편지 번호이다. 토마스 머튼은 《냉전 편지》를 직접 편집하며, 각 편지에 배열 순서대로 번호를 달아 두었다. [본문으로]
- 머튼은 그의 책, 《새 명상의 씨》(New Seeds of Contemplation) 16장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에서 이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본문으로]
- Thomas Merton, The Courage for Truth: Letters to Writers (Harcourt Brace & Company, 1994), 54. [본문으로]
- 로널드 W. 드워킨, 《행복의 역습》(아로파, 2014), 220-222. [본문으로]
'영성공부 > Thomas Mert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상] 미국 의회에서의 토마스 머튼 (0) | 2016.06.08 |
|---|---|
| [논평] “불가해하고 소란한 과학기술용어 세계 속에서의 침묵”에 대한 논평 (0) | 2015.11.23 |
| [서평] 부담 없는 입문서, 아쉬운 연구서 : 키스 제임스의 《토머스 머튼: 은둔하는 수도자, 문필가, 활동하는 예언자》 (0) | 2015.10.15 |